고요손(b. 1995)은 작가 내면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유기적으로
만나는 조각을 만들어 왔다. 작가는 전통적인 조각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는 일상 속 다양한 사물들 가운데서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고, 그 형태를 다양한 시공간적 맥락 안에서 변주시킨다.
그의 비정형적인 조각은 곧 공간을 변형시키고, 그 공간에 관객을 작품의
일부로 끌어들이며 비완결적이고 유연한 매체적 실험과 해프닝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
 《미셸》 전시 전경(얼터사이드, 2021) ©고요손
《미셸》 전시 전경(얼터사이드, 2021) ©고요손고요손은 관객으로 하여금 조각에 대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식과
감각을 이끌어낸다. 작가는 부패하고 사라지는 음식을 조각의 재료로 가져오거나, 스티로폼, 우레탄, 깃털
등 변화의 흔적을 담아낼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거나, 살아있는 달팽이가 조각적 상황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등 매끈하게 다듬어진 조각에 대한 기대를 의도적으로 뒤틀고 그의 조각을 새롭게 바라보고 교감하도록 한다.
2021년 얼터사이드에서 열린 작가의 첫 개인전 《미셸》은 미셸 공드리 감독이 영화에 사용하는 무대 미술 장치를 스크린이
아닌 현장으로 가져오는 상상에서 출발했다. 영화 세팅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그의 조각들은 그 자체로
완결되어 전시되는 것이 아닌, 작가 자신과 관객 그리고 15명의
퍼포머가 ‘미셸’이 되어 조각적 공간 안에서 교감하는 가변적인
상황을 통해 이루어졌다.
 《미셸》 전시 전경(얼터사이드, 2021) ©얼터사이드
《미셸》 전시 전경(얼터사이드, 2021) ©얼터사이드고요손은 이 전시를 통해 “조각에 사람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부여했을
때 다르게 읽히는 모습들”을 실험해보고자 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작가는 퍼포머인 미셸이 조각을 먹거나, 조종하거나, 키우는
달팽이의 놀이감이 되거나, 같이 씻는 모습 등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험 가운데서 작가는 일반적인 조각(작품)과 관객 사이의 경계 또는 규칙을 부수고자 했다. 그는 작품과 관객
사이에 설정된 기존의 역할과 위치를 허물고 사람 또한 움직이는 조각의 일부로 개입시키며 서로에게 스며들 수 있는 동선을 구상했다.
 《미셸》 전시 전경(얼터사이드, 2021) ©얼터사이드
《미셸》 전시 전경(얼터사이드, 2021) ©얼터사이드이처럼 《미셸》은 매일 달라지는 퍼포머와 그에 따라 차이를 생성해 내는 조각의 움직임, 그리고 이러한 가변적인 조각적 상황 속에 매일 새로이 개입되는 관객들의 호흡으로 움직이는 전시였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들은 “누가 어떻게
감상하느냐에 따라 변화하는 조각을 만들고 싶다”는 작가의 의지와 부합하며 오히려 그의 작업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든다.
 《Milky
Way》 별 관측 워크숍 ©코리아나미술관
《Milky
Way》 별 관측 워크숍 ©코리아나미술관2021년 코리아나미술관 *c-lab
프로젝트 《Milky Way》에 참여한 고요손은 자신의 조각을 별 관측 장치로 변모시켰다.
작가는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8인의 참여 연구자들의 답변을 기반으로 별 관측 조각을 제작하고, 야외 공간으로 가져와 관측을 위해 조각에 눕거나 조각 안으로 들어가는 등 다양한 형태의 촉각적인 조각 체험을
공유했다.
 《Milky
Way》 전시 전경(코리아나미술관, 2021) ©코리아나미술관
《Milky
Way》 전시 전경(코리아나미술관, 2021) ©코리아나미술관비누향과 갓 구운 빵 냄새, 부드러운 이불, 별자리 모양의 구멍 등 참여자들의 답변은 작가의 감각에 의해 조각의 형태로 추상화되었다. 그리고 작가는 별 관측이라는 상황 안에 조각을 설치하며, 그 안에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신체를 통한 몰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섬세하게 쌓고 정성스레 부수는 6가지 방법》의 먹는 조각 6점 ©고요손
《섬세하게 쌓고 정성스레 부수는 6가지 방법》의 먹는 조각 6점 ©고요손이처럼 관람자 혹은 참여자의 신체와 뒤엉키고 연결되는 촉각적인 조각을 만들어온 고요손은, 2022년 관객의 몸 안으로 소화되는 ‘먹는 조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 예로, 그의
두 번째 개인전 《섬세하게 쌓고 정성스레 부수는 6가지 방법》에서는 서울의 디저트 가게 여섯 곳과 협업하여
제작한 ‘먹는 조각’을 관객이 직접 구매해 포크와 나이프로
부수어 먹어 치울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작업은 미술관에 전시된 조각 주위로 쳐져 있는 보호 선을 넘어 조각을 파괴하는 상상을 하던 작가의 어릴
적 기억에서 출발한다. 고요손은 적절한 거리 안에서 비접촉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는 통념을
부수고, 관객이 작품을 감상할뿐 아니라 직접 소유하고 창작하며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고요손, 〈사랑의 여름〉, 2022, 《조각충동》 전시 전경(북서울미술관, 2022) ©고요손
고요손, 〈사랑의 여름〉, 2022, 《조각충동》 전시 전경(북서울미술관, 2022) ©고요손이후 고요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이어오며 조각을 매개로 한 감각의 확장을 실험했다. 그리고 협업의 경험은 곧 조각을 활용한 극 또는 공연을 구상하게 되는 단초를 마련했다. 2022년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린 단체전 《조각충동》에서 고요손은 60년대
히피 문화 속 히피들의 모습과 행위에서 포착한 연극적인 장면들을 조각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무대로 활용한
극을 연출했다.
다양한 조각들로 구성된 〈사랑의 여름〉은 관람객이 직접 올라가 조각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좌대이자 조각활용극의
무대로서 기능했다. 작가는 고전 조각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리더의 동상이나 껴안고 있는 연인의 포즈, 움직이는 조각에 인간성의 회복, 자연에의 귀의를 설파하였던 '히피'의 신념을 덧씌우면서 기성의 사회통념,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되, 사랑을
노래하는 조각으로 재탄생시킨다.
 조각활용극 〈사랑의 여름〉(2022) 퍼포먼스 전경 (북서울미술관, 2022) ©고요손
조각활용극 〈사랑의 여름〉(2022) 퍼포먼스 전경 (북서울미술관, 2022) ©고요손또한 타투이스트, 가수, 퍼포머
등과의 협업을 통해 조각에 다른 층위의 관계와 맥락을 발생시킨다. 이는 곧 조각 간의 서사, 퍼포머와 관람객의 움직임, 쉼터라는 기능을 부여 받은 세트 조각과도
결합하면서 무대 단상과 조각 좌대, 연기자와 인물 조각 사이의 간극에 대한 상상과 감각의 확장을 일으킨다.
가령 소품으로 위장한 새로운 조각들이 활용극 때만 모습을 드러내며 또 다른 장면의 레이어를 만들어낸다. 4명의 퍼포머들은 무대 위 각기 다른 성격으로 조각을 활용하는데, 적응에
능숙한 캐릭터의 퍼포머는 적극적으로 조각을 활용하며 조각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고 적응도가 낮거나 무언의 반감을 가진 듯한 퍼포머는 조각의 잔해
혹은 소외된 것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듯 4명의 각기 다른 캐릭터는 고요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실험하던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비춰지는 조각’, 즉 ‘사용자’가 있는 조각을 여러 모습으로 연출하게 된다.
 고요손, 〈이민휘〉, 2024, 이민휘가 만든 자장가와 혼합매체, 의자, 가변 크기, 《곁》
전시 전경(김세중미술관, 2024) ©고요손
고요손, 〈이민휘〉, 2024, 이민휘가 만든 자장가와 혼합매체, 의자, 가변 크기, 《곁》
전시 전경(김세중미술관, 2024) ©고요손2024년 김세중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 《곁》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인물에 대한 기념적 서사를 담은 조각 시리즈를 선보였다. 작가의 아버지 손정호, 독립 기획자 문현정, 음악가 이민휘, 작가 코에시와 장종훈을 포함한 5인의 인물과의 협업으로 완성된 작품은
관객이 자유롭게 보고 만지고, 음악을 들으며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고요손, 〈이민휘〉, 2024, 이민휘가 만든 자장가와 혼합매체, 의자, 가변 크기, 《곁》
전시 전경(김세중미술관, 2024) ©고요손
고요손, 〈이민휘〉, 2024, 이민휘가 만든 자장가와 혼합매체, 의자, 가변 크기, 《곁》
전시 전경(김세중미술관, 2024) ©고요손예를 들어, 음악가 이민휘와 협업하여 만든 작품 〈이민휘〉(2024)는 관객이 의자에 누워 헤드셋을 통해 이민휘가 작곡한 자장가를 들으며 고요손이 제작한 검은 조각을 바라보고
잠들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고요손의 검은 조각은 즉흥성과 비현실성이 혼재된 모습으로 관객을 마주하며
음악을 듣는 과정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푸른 은행잎》 전시 전경(라흰갤러리, 2024) ©라흰갤러리
한편 2024년 라흰갤러리에서의 개인전 《푸른 은행잎》에서는 작가가
간직한 소중한 기억 하나를 과거로부터 가져와 현재의 시공간에 펼쳐 놓았다. 작가는 전시를 통해 과거
특정 순간을 회상할 때 불분명하게 시각화되는 대상과, 뚜렷하게 남아 있는 내면의 감회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실험했다.
작가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가는 비선형적인 시간의 구조를 전시
공간 전체를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풀어냈다. 어머니의 두 손에서 영감을 받은 조각이 전시장 야외에서 관객을
마주하고, 뒤이어 ‘죽은 새’ 작업이 난데없이 관객 앞에 나타나 현실과 묘하게 동떨어진 기이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계단을 오르며 이어지는 작업들은 공간 곳곳에서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상태로 자리하며 작가의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경계 안으로 관객을 끌어들인다.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4.0》 전시 전경(백남준아트센터,
2025) ©백남준아트센터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4.0》 전시 전경(백남준아트센터,
2025) ©백남준아트센터이처럼 고요손은 조각을 주변 존재와의 관계적 작용 안에서 이해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주변과 자유로이 관계하는 그의 조각은 계속해서 자신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며 새로운 조각의 가능성을 제시해 오고있다.
”감각을
대하고, 확장하고, 전달하고자 할 때, 그 감각을 마주한 사람의 몸 속에 하나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작업을 경험하고, 보고 느끼는 분들에게 곧바로 감각의
거대한 확장이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심은 씨앗이 어딘가에서 발아되는 것,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새싹이 됐다가 열매가 되고, 몸에 진득히 눌러
붙어 있던 습관들을 천천히 하나씩 깨주는 것, 그리고 그 깨주는 공간 안에 어떤 감각을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금씩 늘려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요손, 코리아나미술관 *c-lab 5.0 프로젝트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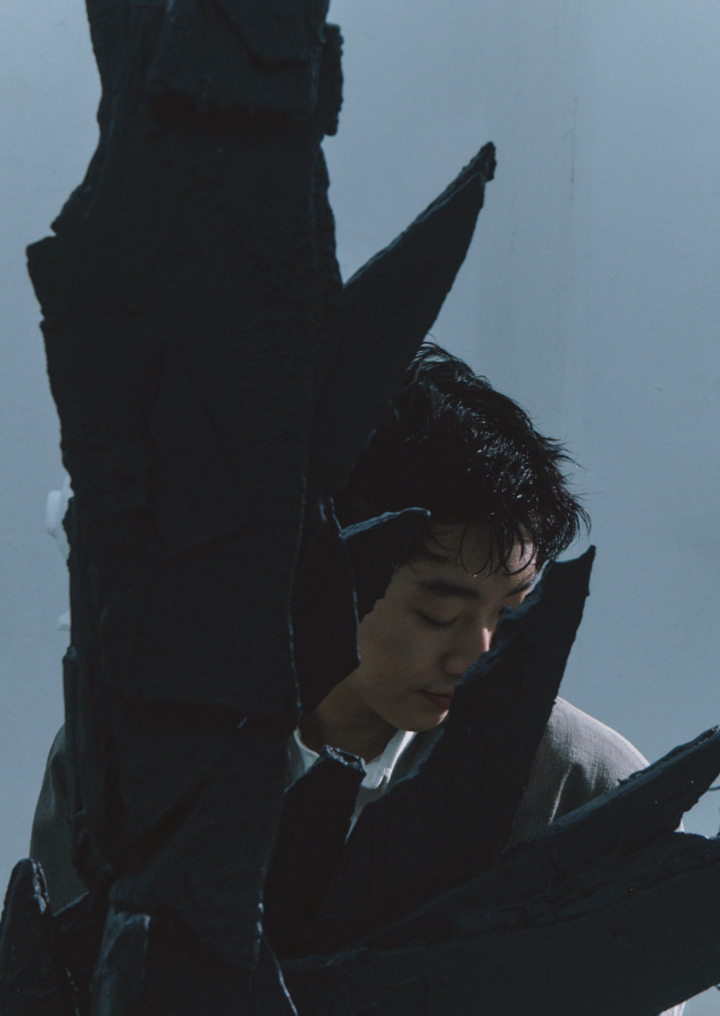
고요손 작가 ©서울예술상
고요손은 동양화를 전공하고, 회화 바깥으로 나와 시와 퍼포먼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조각 설치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개인전으로는 《푸른 은행잎》(라흰갤러리, 서울, 2024), 《곁》(김세중미술관, 서울, 2024), 《섬세하게
쌓고 정성스레 부수는 6가지 방법》(디저트 가게 6 장소 (원형들, 섬광, 무너미, 토오베, 심드렁, 수르기), 서울, 2022), 《미셸》(얼터사이드, 서울, 2021)이
있다.
또한 그는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4.0》(백남준아트센터, 용인, 2025),
《두산아트랩 전시 2025》(두산갤러리, 서울, 2025), 《마테리델리아》(미래빌딩, 서울, 2024), 《제일
뒤가 가장 앞이다》(PS CENTER, 서울, 2024), 《세
개의 전날 저녁》(페리지갤러리, 서울, 2023), 《포스트모던 어린이》(부산현대미술관, 부산, 2023), 《조각충동》(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22)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5년 제3회 서울예술상
‘포르쉐 프런티어상’ 시각 부문에 고요손 개인전 《곁》이
선정되었으며, Platform-L Live Arts Program 2019 최우수 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References
- 고요손, Goyoson (Artist’s Instagram) :
- 아트렉쳐, 고요손: 그가 아닌 그들 그리고 <미셸> :
- PS CENTER, 제일 뒤가 가장 앞이다 (PS CENTER, End vs And) :
- 디자인프레스, 조각가 고요손이 깎아낸 감각의 세계, 2021.07.13:
- 코리아나미술관, *c-lab 5.0 프로젝트 X 고요손 《Milky Way》 (Coreana Museum of Art, *c-lab 5.0 Project X Goyoson 《Milky Way》) :
- 북서울미술관, 조각 충동 (Buk-Seoul Museum of Art, Sculptural Impulse) :
- 김세중미술관, 곁 (Kimsechoong Museum, Alongside) :
- 라흰갤러리, 푸른 은행잎 (Laheen Gallery, Blue Ginkgo) :
-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랩 전시 2025 (DOOSAN Art Center, DOOSAN Art Lab Exhibition 2025) :






















